봄도 봄이 아니로다(春來不似春) : 왕소군의 슬픈 전설
컨텐츠 정보
- 0댓글
-
본문
봄도 봄이 아니로다(春來不似春) : 왕소군의 슬픈 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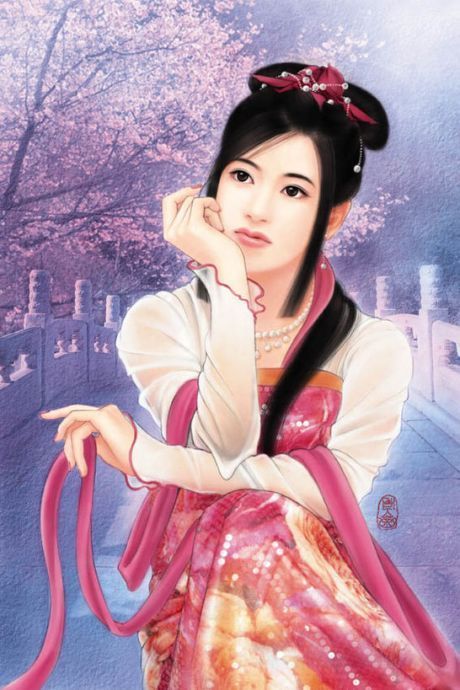
왕소군(王昭君)은 서시(西施), 초선(貂蟬), 양귀비(楊貴妃)와 함께 중국의 4대 미인으로 일컬어진다. 형주 남군(南郡) 출신으로 이름은 장(?)이며 자는 소군(昭君)이다. 소군은 자(字)라기보다 후궁들에게 수여하던 내명부 관작 칭호 중 하나이다. 그녀는 왕장(王?)이라는 이름보다 왕소군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진대(晉代)에는 왕명군(王明君) 또는 명비(明妃)라고도 하였다. 진(晉)의 문제(文帝) 사마소(司馬昭)의 이름과 글자가 같았기 때문이다.
전한(前漢) 원제(元帝, 재위: BC 49∼BC 33)의 후궁이었으나, BC 33년 화번공주(和蕃公主)의 자격으로 흉노의 호한야(呼韓邪) 선우(單于 : 왕)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으며, 아들 이도지아사(伊屠智牙師)를 낳았다고 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왕소군이 흉노국의 왕비로 지내는 동안 한나라에 있는 그녀의 형제들은 높은 관직을 받았으며, 흉노국에도 사신으로 여러 차례 왕래하며 소군을 만났다. 소군의 두 딸도 한나라에 와서 원제의 황후였던 태황태후를 모시기도 하였다. 소군의 노력으로 한 동안 한나라와 흉노 사이에는 평화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태황태후의 조카였던 왕망이 한나라를 무너뜨리고 신(新)나라를 세우게 된 뒤에는 흉노국이 왕망을 인정하지 않고 변방을 수시로 침범하여 전란이 끊이지 않았다.
왕소군은 자신의 비극적인 삶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 흉노와 한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한다. 그녀의 무덤은 대흑하(大黑河) 기슭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의 내몽고 후허호트(呼和浩特) 시 남쪽 9Km 지점이다. 드넓은 북방의 초원에 가을이 오면 모든 초목이 다 시들게 마련이지만, 왕소군의 무덤에 난 풀들은 시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무덤을 청총(靑?)이라 부른다고 한다.
왕소군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한서(漢書) 원제기(元帝紀)와 흉노전(匈奴傳), 후한서(後漢書) 남흉노전(南匈奴傳) 등에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을 뿐 그녀의 생몰(生歿) 등 전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그러나 왕소군에 대한 이야기는 시가, 소설, 희곡, 민간설화 등 각종 문학 양식을 통해 후세 중국인들에게 끊임없이 회자(膾炙)되었다. 역사적 사실세계의 왕소군에 대한 기록은 빈약하지만, 왕소군의 슬픈 이야기는 중국문학에 허다한 소재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다양한 문학의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재창조된 왕소군은 흉노와의 화친정책 때문에 희생된 비극적 여주인공으로 윤색, 미화되어 많은 중국인들의 심금을 울리는 가슴 아픈 전설로 전해져 왔던 것이다.
갈홍의 서경잡기(西京雜記)에 의하면, 한의 원제(元帝) 건소(建昭) 원년에 전국적으로 후궁을 모집하였다. 이때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수천 명의 후궁 중에 왕소군도 포함되었다. 원제는 수천 명이나 되는 후궁들을 일일이 대면하거나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화공 모연수(毛延壽)에게 초상화를 그리게 한 다음 초상화를 모은 화첩을 보고 시침(侍寢)할 후궁을 골랐다고 한다. 이렇게 되자 대부분의 후궁들이 화공에게 자신의 모습을 예쁘게 그려달라고 뇌물을 바쳤다고 한다. 그러나 왕소군은 집안이 빈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용모를 황제에게 속일 마음이 없었으므로 뇌물을 바치지 않았다. 결국 모연수는 뇌물을 바치지 않은 왕소군을 괘씸하게 여겨, 그녀의 용모를 아주 평범하게 그린 다음 얼굴에 점까지 찍어 버렸다는 것이다. 당연히 왕소군은 황제의 눈에 띌 수가 없게 되었으며, 입궁한 지 5년이 지나도록 황제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게 되었다.
왕소군은 황제의 승은은 고사하고 궁중의 허드레 일을 하면서 힘든 나날을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왕소군은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고독한 후궁생활 중에도 틈틈이 독서와 서예는 물론 그림과 가무(歌舞) 등을 익히면서 자신을 가꾸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원제(元帝) 경녕(竟寧) 원년(BC 33)에 기약도 없이 힘들고 쓸쓸한 후궁생활을 하던 왕소군에게 마침내 그녀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남흉노(南匈奴)의 선우(單于)인 호한야(呼韓邪, 재위 BC58~ BC31)가 원제를 알현하기 위해 장안으로 왔던 것이다.
당시 흉노에는 내란이 발생하여 호한야의 형인 질지골도(?支骨都)가 북흉노(北匈奴)를 세워 남흉노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한의 서역도호(西域都護) 감연수(甘延壽)가 북흉노를 정벌하고 질지골도를 죽이자, 호한야가 원제에게 신하의 예를 갖추고 알현을 청하였다. 이에 원제는 호한야를 환대하였으며, 호한야는 원제에게 사위가 될 것을 청하였다.
원제는 호한야의 청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한편, 호한야에게 한나라 황실의 위엄을 과시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황제의 총애를 받지 못한 후궁들을 불러 연회의 시중을 들도록 하였다. 이때 호한야는 시중을 들고 있던 수 많은 궁녀 중에서 절세미인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왕소군이었다. 왕소군에게 마음이 기운 호한야는 당초의 제안을 바꾸어 황제의 사위가 되기를 원하지만 꼭 공주가 아니어도 좋으며, 저 후궁 중의 한 명이라도 좋다고 하였다.
내심으로 종실의 공주를 보내고 싶지 않았던 원제는 즉석에서 호한야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시중 들던 후궁 중에서 한 사람을 호한야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였다. 호한야는 말할 것도 없이 왕소군을 지목하였다. 원제는 호한야가 왕소군을 지목한 뒤에서야 비로소 왕소군을 보게 된 셈인데, 자신의 시력을 의심할 정도로 천하절색일 뿐만 아니라 행동거지도 단아하기 짝이 없었다. 원제는 왕소군을 호한야에게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황제로서 한 번 내린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었다. 연회가 끝난 후 원제는 후궁들을 그려 놓은 초상화첩을 펴놓고 대조해 보았다. 그런데 왕소군의 그림은 실제 모습과 천양지차로 다를 뿐만 아니라 얼굴에 점까지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노한 원제는 소군을 추하게 그린 화공 모연수(毛延壽)를 황제를 기만한 죄로 참형(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